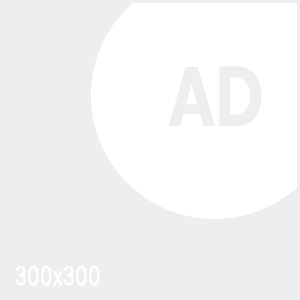추수감사절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절기는 아니지만, 구약의 맥추절과 수장절처럼 수확의 결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전통 속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1621년 미국 청교도들이 첫 수확을 감사하며 드린 예배는 이러한 성경적 전통을 계승한 것이며, 노동의 결실을 하나님께 바치는 개혁주의 신앙윤리가 담긴 절기였습니다. 이처럼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노동이 함께 만들어낸 열매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본래 농경 중심의 전통적 의례는 있었으나, 기독교적 의미를 담은 추수감사절 문화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절기가 한국교회에 빠르게 정착한 이유는 전후 폐허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 신앙이 공동체 회복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궁핍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고백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현실을 견디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정신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한국 사회가 경험한 고난을 신학적으로 재해석하고 이겨낼 수 있는 감사의 틀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개신교의 영향은 결정적이었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 전해진 개혁주의 전통은 성경 중심의 삶, 소명 의식을 가진 노동, 그리고 공동체적 책임을 강조하는 보수주의적 신앙 윤리를 한국교회에 심어주었습니다. 특히 이 신앙 윤리는 한국 사회의 근대화·산업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즉, 성실한 노동을 통해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통해 공동체를 지탱하며, 공동체적 책임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는 순환적 윤리 구조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는 외래 신앙이 아니라 한국인의 일상생활과 사회 구조 속에서 실천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윤리적 자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이러한 가치들을 한데 묶어 신앙적으로 확인하는 절기가 되었고, 한국교회의 도덕적 기초를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의 추수감사절은 미국 문화의 단순한 수입이 아니라 한국적 현실에 맞게 재해석된 신앙 전통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농경 사회가 해체되고 산업·도시 중심의 사회로 전환되었음에도, 추수감사절은 여전히 “삶 전체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을 단절시키지 않고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보수주의적 전통 이해의 방식이 한국교회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산업 구조와 노동의 형태가 크게 변화하였어도,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은 신앙의 중요한 태도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과거의 관습이 아니라 오늘의 신앙을 지탱하는 감사의 질서이며,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우리의 자세를 바로 세우는 소중한 전통입니다.
Tradition and Gratitude: The Meaning of Thanksgiving in the Korean Church
Thanksgiving Day does not appear explicitly in the Bible, yet its meaning can be traced to the Old Testament feasts—such as the Feast of Weeks and the Feast of Ingathering—which were rooted in offering the fruits of harvest back to God. When the Pilgrims held their first thanksgiving in 1621, they were inheriting this biblical tradition. It was not merely a communal meal but a confession that the fruit of human labor belongs ultimately to God’s providence.
In Korea, while agrarian rituals existed, there was no Christian harvest celebration like Thanksgiving. Nevertheless, the holiday took deep root within Korean churches because gratitude became a spiritual anchor during the nation’s postwar devastation. In times of poverty and social upheaval, the confession “everything is God’s grace” served not merely as comfort but as a moral and psychological foundation that enabled people to endure hardship and pursue a hopeful future. Thus, Thanksgiving became a theological framework through which suffering could be interpreted and transcended.
The influence of American Protestantism was crucial in this process. Through the work of missionaries, Korean Christianity inherited a conservative Protestant ethic that emphasized biblical authority, the vocation of labor, and communal responsibility. This ethic became profoundly significant during Korea’s modernization.
A cyclical moral structure emerged: faithful labor strengthens the family; strong families sustain the community; and responsible communities contribute to the nation’s flourishing. This was not an imported abstraction but a value system that took root in the everyday lives of Koreans, becoming a practical ethical asset that shaped both personal character and collective development. Thanksgiving served as a focal point through which these values were reaffirmed and internalized.
Over time, Korean Thanksgiving has become more than an adaptation of American culture; it has matured into a distinctly Korean Christian tradition. Even as society transitioned from agrarian to industrial and urban forms, the holiday expanded into a day for offering the whole of life to God in gratitude. This reflects a conservative understanding of tradition—preserving what is essential while applying it to new realities.
Though the structure of labor has changed dramatically, setting apart a day to give thanks to God remains a vital practice of faith. Thanksgiving is not a relic of the past but a living order of gratitude, grounding the faith and character of the Korean church to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