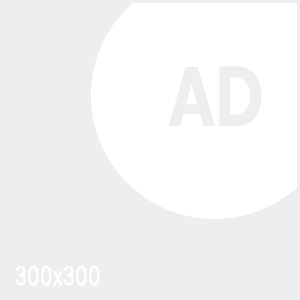— 지식주의의 맹점
오늘날 지식을 얻는 방식은 매우 다양합니다. 지식을 얻기 위해 책만이 유일한 수단이라는 생각은 이미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TV, 인터넷, 잡지 등 여러 매체들은 20~30년 전보다 훨씬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설명하며,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로지 책만을 고집하는 기성세대의 지식관은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관심 있는 분야를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유튜브 같은 플랫폼을 통해 간접경험을 할 수 있으며, 때로는 실제 경험자와 같은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처럼 시각적 자극을 극대화한 간접경험은 뇌에 착각을 일으킬 만큼 강렬한 희열과 피로감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집에서도 유튜브 하나만으로도 지식 습득의 완성도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지식의 완성도와 방대함에 있어 인간은 결국 컴퓨터에게 주도권을 내어줄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구글이나 챗GPT와 같은 AI 기반 검색 플랫폼은 이미 사람들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으며, 지식 전달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식의 완성도란 무엇이며, 그것이 개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 야고보서 1장 25절
성경은 지식을 실천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라 말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원리는 형식적인 교회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 불리는 ‘성도’들의 삶과 행동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성도가 지식을 머리로만 외우고 있다면, 신약이 말하는 기독교의 본질, 즉 ‘사랑’을 실천하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결국 지식은 개개인의 행동을 이끄는 원동력이자 지침일 뿐입니다.
“학문에 대해서라면 아마도 내가 남보다 못하지 않겠지만, 군자의 도리를 몸소 실천하는 것은 아직 이루지 못했다.”
— 『논어』, 술이편 제7, 제32장
공자는 논어에서 학문에 대해 자신이 남보다 뒤처지지는 않지만, 군자의 도리를 실천하는 데에는 미치지 못했다며 겸손을 보입니다. 논어의 목적은 독자로 하여금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군자가 되기 위한 길을 걷도록 이끄는 데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논어의 내용을 자랑하기 위한 지식으로만 사용한다면, 그것은 공자의 집필 의도와는 정반대의 행위일 것입니다. 지식은 결국 개개인을 변화시키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성경이든 논어든, 지식은 단지 머리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세상의 지식 속에서 개개인의 삶이 방향 없이 떠돌게 된다면, 이는 주객이 전도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식의 완성도는 외부 기준에 따라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자기 기질과 삶의 방향성을 얼마나 잘 살려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 완성의 과정과 결과는 결코 타인과 비교될 수 없는 고유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세상에 보다 선한 지식이 축적되어 가기를 바라는 마음일 뿐입니다.
Why Do We Study?
— The Blind Spot of Intellectualism
Today, there are countless ways to acquire knowledge. The idea that books are the only legitimate source of knowledge is now an outdated notion. Compared to 20–30 years ago, media such as TV, the internet, and magazines are much more scientific and objective in the information they provide. Consequently, the older generation’s rigid view of knowledge centered only on books is inevitably fading.
Even without directly experiencing a field of interest, we can gain indirect experiences through platforms like YouTube and sometimes even feel emotions similar to those of actual participants. These visually stimulating experiences can be so intense that they cause the brain to feel both euphoria and fatigue. Compared to the past, the completeness of knowledge we gain at home through platforms like YouTube has significantly increased.
However, when it comes to the vastness and completeness of knowledge, humans are nearing the point where they will have to yield the lead to computers. AI-based platforms like Google and ChatGPT have already become deeply embedded in our lives, taking on the role of primary knowledge providers. In this context, what the completeness of knowledge means to individuals becomes even more crucial.
“But whoever looks intently into the perfect law that gives freedom, and continues in it—not forgetting what they have heard, but doing it—they will be blessed in what they do.”
— James 1:25
The Bible tells us that those who practice knowledge will be blessed. The core of Christianity does not lie in the formal structure of a church building, but in the actions and lives of the believers, known as the “church.” If a believer merely memorizes knowledge, the New Testament urges them to practice the essence of Christianity—love. Knowledge, therefore, is only a tool to guide individual action.
“In terms of learning, perhaps I am no worse than others. But in putting the way of the gentleman into practice—I have not yet succeeded.”
— The Analects, Book 7, Chapter 32
In The Analects, Confucius humbly admits that while he may not lack in learning, he has yet to truly live out the way of a gentleman. The purpose of The Analects is not to encourage people to simply gain knowledge, but to become “junzi” (virtuous people) through their actions. If someone were to flaunt the book as a source of intellectual pride, it would contradict Confucius’ intent. Knowledge is a tool to transform the self.
Whether in the Bible or in The Analects, the purpose of knowledge is to prompt personal change and action. If one’s life is swept away by the vast sea of knowledge without direction, it may be a case of mistaking the means for the end. Ultimately, the completeness of knowledge is not measured externally, but internally—through how well one’s temperament and values are expressed. The process and result of that completeness are unique and incomparable.
All we can hope for is that good and virtuous knowledge continues to accumulate in the world.
私たちはなぜ学ぶのか
— 知識主義の盲点
現代では、知識を得る手段は多様化しています。もはや「本だけが正しい知識を得る方法である」という考え方は時代遅れになりました。テレビ、インターネット、雑誌など、さまざまなメディアは、20〜30年前よりも科学的で客観的な情報をより正確に伝えています。したがって、本に固執する旧世代の知識観は、徐々に衰退していくのが現実です。
自分が興味を持つ分野を直接体験しなくても、YouTubeなどを通して間接的に体験し、時には実際の体験者と同じような感情を抱くことさえあります。このように視覚的な刺激を最大化した間接体験は、脳に錯覚を起こさせるほどの快感や疲労感をもたらすことがあります。今では、家にいながらYouTube一つで得られる知識の完成度は、過去に比べて大幅に向上しました。
しかし、知識の完成度や広がりという点では、人間がコンピュータに主導権を譲る日が近づいています。GoogleやChatGPTのようなAIベースの検索プラットフォームは、すでに人々の日常に深く入り込み、知識の担い手としての地位を確立しています。その中で、知識の完成度が個人にとってどのような意味を持つのかがますます重要になっています。
「自由をもたらす完全な律法を熱心に見つめ、それを聞いて忘れるのではなく実行する人は、その行いによって祝福されるでしょう。」
— ヤコブの手紙 1章25節
聖書では、知識を実行に移す者が祝福を受けると語られています。キリスト教の核心は、形式的な教会の建物ではなく、「教会」と呼ばれる信徒たちの生き方と行動にあるのです。知識をただ頭の中で記憶しているだけの信徒がいれば、新約聖書はその人にキリスト教の本質である「愛」を実践するよう勧めています。つまり、知識は個人の行動を導くための道具にすぎません。
「学問については、おそらく私は他の人と劣らないだろう。しかし、君子の道を自ら実践することに関しては、まだ成し遂げていない。」
— 『論語』 述而第七 第三十二章
『論語』で孔子は、学問については人に劣らないとしつつも、君子の道を実践するにはまだ至っていないと謙虚に述べています。『論語』の目的は、読者に知識にとどまらず、自ら「君子」になるための道を示すことにあります。もし誰かがこの書を知識自慢のために使うのであれば、それは孔子の意図に反する行為でしょう。知識は結局、自己を変化させるための手段にすぎません。
聖書でも論語でも、知識は頭にとどめるだけでなく、行動へと移すべき理由が語られています。広大な知識の海に流されて人生の方向性を見失ってしまうならば、それは本末転倒と言えるでしょう。結局、知識の完成度とは外から測れるものではなく、自分の内面から、自らの気質と価値観をどれだけ表現できたかによって決まります。その完成のプロセスと結果は、他人と比較できない唯一無二のものです。
私たちが願えるのは、より善き知識がこの世に蓄積されていくことだけなの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