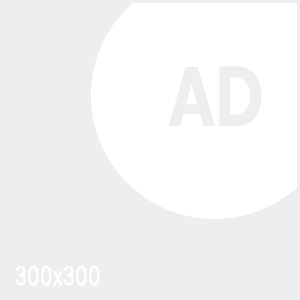조선왕조실록에는 일본과의 관계가 단순히 대립과 적대의 역사로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왜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과 외교 교섭의 사례들은 동아시아 질서 속에서 양국이 공존을 모색했던 흔적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한일 관계를 다시 바라보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한일 관계를 ‘피해-가해’의 틀에서 ‘공존-경쟁’의 역사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구의 약탈은 조선과 일본 모두에 피해를 주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은 이미 양국의 실용적 외교 감각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국제 안보와 경제 질서의 불안정 속에서도 양국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모색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둘째, 한일의 역사를 ‘단절의 서사’가 아닌 ‘문명의 연속’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조선의 성리학, 일본의 무사도, 불교와 도자기 문화 등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했습니다. 이는 과거를 미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문명이 함께 축적되어 온 역사라는 사실을 인정하자는 의미입니다.
셋째, 관계의 회복은 정치의 기억이 아니라 시민의 기억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조선시대의 외교는 단순한 정략이 아니라 문화 교류와 상호 이해의 노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에도 한일 시민이 ‘위협의 대상’이 아닌 ‘이웃한 문명’으로 서로를 인식할 때, 진정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조선왕조실록의 일본 관련 기록은 과거의 상처를 넘어 협력의 기억과 문명의 연속성 속에서 한일 관계를 재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그것이야말로 감정의 회복을 넘어선, 성숙한 외교적 보수주의의 출발점입니다.
Rediscovering the Memory of Cooperation i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record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not merely as one of hostility and conflict. In particular, the cases of cooperation and diplomatic negotiation over the issue of Japanese pirates (Wakō) reveal that both nations once sought coexistence within the East Asian order. These historical traces offer valuable insights into how contemporary Korea–Japan relations might evolve.
First, the relationship must be viewed not through the binary of “victim and aggressor,” but as a history of “coexistence and competition.” The piracy that afflicted both coasts harmed both peoples, and the efforts to resolve it together reflected a pragmatic sense of diplomacy already present in the premodern era. This perspective reminds us that even today, amid global insecurity, both nations share common interests that call for cooperation.
Second, Korea and Japan should be seen not as civilizations divided by history but as parts of a continuous cultural and intellectual heritage. Neo-Confucianism in Joseon, the Japanese samurai ethos, Buddhism, and ceramic culture all developed through mutual influence. Recognizing this is not about idealizing the past, but about acknowledging that the two societies have long been co-authors of a shared civilization.
Third, genuine reconciliation must arise not from political memory but civic memory. The diplomacy of the Joseon era was not merely strategic but cultural—it was rooted in sustained efforts toward understanding and exchange. Likewise, when the citizens of both nations begin to perceive each other not as threats but as neighboring civilizations, a deeper trust can emerge.
Ultimately, the Annals remind us that the Korea–Japan relationship should be reinterpreted not in the shadow of past wounds but through the memory of cooperation and the continuity of civilization. This perspective marks the beginning of a mature, conservative diplomacy—one that values prudence, respect, and coexistence over resentment.